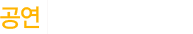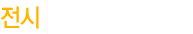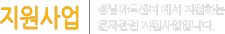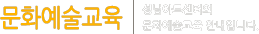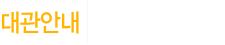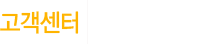입주자소개
- 공공예술창작소를 소개합니다.
- 홈 > 지원사업 > 공공예술창작소/청년예술창작소 > 신흥공공예술창작소 > 입주자소개



박승예&김달 1기 입주프로젝트팀
관리자 / 2017-08-03조회 : 672
신흥공공예술창작소 2017년 1기 입주프로젝트팀
박승예 Seungyea Park
박승예 작가는 괴물은 그린다. 이 괴물은 개인으로서의 그것과 시스템 안에서의 그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불안이 벌이는 잔혹과 폭력, 다름에 대한 부정, 오만,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묵인의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왜 괴물이 되어가는가를 펜과 아크릴물감을 사용한 드로잉작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뉴욕의 롱아일랜드대학교 사우스햄턴 캠퍼스에서 학사를, C.W.Post 캠퍼스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쌈지농부 아트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스튜디오, 영은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2011년 소버린 아시아 예술상 Top40, 2014년 종근당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다. 성곡미술관, 남서울시립미술관등에서 그룹전을, 소마미술관,
영은미술관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괴물은 내 안과 밖에 있다. 그들은 공존한다.
내 밖의 그것이 내 안의 그것을 보는 순간 질겁하며 누가 알아챌라 장막을 덮어 감추어야할
것으로 화들짝한다. 내 안의 그것이 내 밖의 거것을 보는 눈은 경멸과 구역질로, 체념으로
붉어진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서로를 괴물로 인지한다.
그러나 그중의 하나도 말살되어질 수 없다. 그것의 말살은 결국 식물인간으로의 사멸이나,
분열로의 종말을 의미하는 극단적 결말에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결국 그리도 모순되게 미약하며 모순되게 악랄하다.

공포는 막강의 '방어'에 당위성을 스스로 부여하곤 한다. 이로, 공격은 방어를 위한 장치로의
당위성을 부여박게 된다. 공포는 잔혹의 폭력을 행사한다. 공포에 젖은 이는 두 손을 휘둘러 자신을 방어
하려하는 동안 그 휘둘려진 손바닥과 주먹과 손톱으로 타인의 눈을 할퀴고, 얼굴을 치고, 피를 묻히곤
한다. 타인의 피를 묻힌 나의 손 역시 방어를 위한 공격의 뚜렷한 상처를 갖게 된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는다.

오만은 그 형체를 명료히 하지 않는다. 때로 그것은 지극한 관용과 인정의 모습으로, 때로
그것은 이해와 수용의 모습으로, 때로 그것은 관대한 개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기실에 있어서의 실체와는 정반대의 허울을 쓰고 등장하여 나를 위장하며 상대를
기만하기도 한다.

나의 작업에 있어 곡선의 무수한 반복은 '행위'의 주안점을 상징한다.
나의 손이 펜촉을 타고 캔버스나 종이 위를 무수한 곡선으로 헤매어 무의식의 흔적을 구상화된
결과로 내뱉어 놓게 된다. 이 곡선의 반복의 '행위'는 구상적 결과를 만들어놓는 추상적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무의식이 뱉어놓은 의식의 일편이라 할 수 있다.
김달 Dal Kim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떠올리고, 같은 순간의 기록도 다른 기억으로 적힌다. 기억이라 부르는 커다란 범주 안에 상생하는 추억과 망각은, 시간의 보살핌으로 윤화되었거나 시간의 생존본능으로 솎아낸 악몽이다. 또한 기억이란, 나의 경험의 역사뿐 아니라 누군가의 기록을 나에게 보관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저장소이다. 내 것 또한 그리 될 수 있다.
조형예술학과 사진을 공부한 후 큐레이터로 근무했었던 작가는 이러한 기억의 윤화, 망각, 이들의 공존, 타인과의 교환, 선별 그리고 오류 등을 글과 사진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솎아나간 악몽의 빈 자국, 그리고 물질화된 세상을 살며 자발적 선택이 아님에도 쉽게 선택되고 내쳐지는 기록에 주의를 기울인다.
공중에 매달린 묵직한 종이는 벽을 통해 나온 빛에 의해 고요히 발광하는 중이다. 바닥에 쓰러져가는 작은 주검들을 끌어안듯 떠있는 네모난 어둠은 관람객에 의해 일렁인다. 벽을 통해 비집고 나온 작은 빛들은 무슨 말을 할 듯, 하지만 소리 없는 응시로, 마치 엄마 뒤에 숨은 어린아이의 눈길과 닮아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작품에 가까이 다가서면 그들은 마음 안에 가두고 있는 말을 입술 끝에 매달아 입을 반쯤 열어 놓은 채 있다. 그 열린 틈 사이로 터져 나오는 원망은 빛이 되어 전시장 이곳저곳을 떠돌고 관람자의 눈과 마음에 실려 함께 넘실된다. 죽은 나무, 죽은 화초, 검게 흐르는 캔버스. 마치 사진에서의 스투디움(Studium)*처럼 전시장에 감도는 평균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 사건은 바다가 가진 포근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자비 없이 갈퀴질해갔다.
김달 「박명미<낮은 물음>展」 서문 中
vagabondal@naver.com